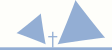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10/24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1. 재무(財務)와 재정(財政), 재정법률(財政法律)
2018/10/28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2. 재무(財務) 조직의 의의와 변천
2018/10/31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3. 조세(組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
2019/08/19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4. 관세(關稅) 및 국경관리(國境官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
지난 포스팅에서는 조세와 국경관리 사무를 함께 장리하는 관세 및 국경관리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입과 세출 못지 않게 중요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와 물자의 도입을 장리하는 조달(調達) 및 물자관리(物資管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 조달(調達) 및 물자관리(物資管理)의 의의와 변천
물자(物資):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 (표준국어대사전)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표준국어대사전)
공유재산: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표준국어대사전)
정부에게 있어 물자(物資)는 행정 및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과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과 자산은 존재 형태에 따라서 부동산, 동산, 권리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소유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각각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 또는 외국의 차관을 통하여 물자를 구매하고, 이를 행정 및 국방에 사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데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물자에 대한 구매, 관리,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장리하는 행정이 국가의 조달 및 물자관리 사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물품관리법(物品管理法), 공유재산법(公有在産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은 총칙, 총괄청, 국유재산관리기금, 행정재산, 일반재산, 지식재산 관리, 처분의 특례, 대장과 보고, 보칙, 벌칙의 총 9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청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며, 이를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은 관리와 처분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법(物品管理法)은 총칙,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의 관리, 보칙의 5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 제도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며, 사무의 총괄청은 조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 사무는 각 중앙관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을 의미하며,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軍需品管理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은 물품을 관리하는 일반법으로 구체적인 취득, 사용, 처분, 자연감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公有在産法)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서 총칙, 공유재산 통칙, 행정재산, 일반재산, 지식재산 관리, 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물품 통칙, 물품의 관리, 보칙, 벌칙의 10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 또는 조달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다.
국고(國庫): 현금을 수납하고 지급하는 주체로서의 국가를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계약(契約):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표준국어대사전)
정부는 이러한 물자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거나, 직접 생산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법(公法)과 행정의 의미에서의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법(私法)의 의미에서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관계를 국고(國庫)관계라 하며 공법에서 인정되는 행정 주체로서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 시에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서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民法)이 적용되지만, 국가가 하는 계약은 일반 당사자간의 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조건이 필요하기에 국가계약법(國家契約法)을 통해 세부적인 계약 방법 및 계약 주체, 객체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2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달(調達):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 줌 (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시작인 구매(購買)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제한된 예산에서 안정적인 목적의 달성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달은 시장 참여자들에서도 공공조달과 같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조달(公共調達)은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조달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그 집행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달에 비하여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법성, 공공성, 투명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과정중심의 계약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다소 경직성을 띤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 전반을 규정하는 법에는 조달사업법(調達事業法)이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과 함께 조달 행정 관련 법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중요한 방향만을 정해 놓고 실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인 대통령령과 부령, 회계예규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사항들은 법보다는 하위규정에 많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18.]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앞서 살펴본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물품관리법(物品管理法), 국가계약법(國家契約法), 조달사업법(調達事業法)의 조달4법을 기반으로 조달 및 물자관리 사무를 살펴본다면 총 3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는 공공조달(公共調達) 사무,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물품과 재산을 관리하는 물자관리(物資管理) 사무, 그리고 시장 참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하는 관급경제(管給經濟) 사무가 그것입니다.
공공조달(公共調達)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부분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공조달은 단순한 구매와는 달리 구매기능을 포함하는 다소 광범위한 용어이며 구매와 저장, 운송, 수납, 검사, 폐품처리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경제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성과중심의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조달과는 달리, 조달관련 법령에 의한 사전적 제한과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검증으로 인하여 적법성과 조달기능을 통한 정부 시책 지원과 같은 공익기능이 우선시 되곤 합니다.
공공조달의 세부적인 구분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여 구매계약과 용역계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출처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지 및 제공지에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자(內資)'와 해외 자금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외자(外資)'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자구매 계약의 경우 계약방법에 따라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급방법에 따라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자구매 계약의 경우 예산과 해외 차관자금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1999년을 끝으로 더 이상 차관자금 구매는 없습니다. 용역계약(用役契約)은 용역 내용에 따라서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구분은 행정적 구분으로 기술용역에는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용역', '전력기술용역', '정보통신기술용역', '소방용역', '측량용역' 등이 속하게 되고, 이외의 것은 일반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재화의 구매와 용역계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설공사(施設工事)의 경우 공사계약으로 특수한 형태의 공공조달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구매의 발주체계는 일반기관의 구매는 조달청에서, 군수물자의 구매는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는 이원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반기관의 중앙조달은 일정규모 이상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자 및 시설공사만을 담당하고, 이외에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전체 공공구매에서 약 30% 수준인 20조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방위사업청과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를 중앙조달(中央調達)이라고 합니다. 중앙조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인도, 대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앙조달은 대량으로 일괄 구매로 경쟁에 의한 가격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일 수 있으며, 전체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표준화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정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매만을 담당하는 기관과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조달, 계약 행정이 가능하며, 집중된 정부구매권을 활용하여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안정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앙조달 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표준화로 말미암아 다양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소기업 우대'라는 명목 때문에 염가의 저품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고품질 물품을 조달받기가 힘들어 행정의 효율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조달의 비중을 줄이고 분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공공조달 및 시설공사 발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업자들간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분산조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자치제도의 불완정성으로 인해 단가가 높아지고,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등 분권화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조달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중앙조달의 단점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실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전자조달 체제입니다.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전자조달 '나라장터'는 그동안 수시로 조달요청이 이루어지기에 중앙보급창에 미리 구매해둔 소모성 물품을 오프라인으로 공급하던 체계를 바꾸어,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주문요청이 있을 경우 조달업체가 수시로 납품하는 계약방식인 단가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조달체계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조달 진입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여서 많은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물자관리(物資管理)는 정부가 행정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산을 취득, 보유하여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기술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물품과 자산의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과 정부예산의 적정한 사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물품관리(物品管理)는 표준화와 분류를 통해서 전(全) 부처와 기관이 동일하게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산(動産)이면서 사용 빈도가 빈번하고, 소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총괄하고 있으며, 실제 관리 사무는 각 중앙관서의 총무과 내지 운영지원과의 물품관리관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품관리가 동산(動産)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산관리(資産管理)는 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토지, 시설과 같은 부동산(不動産)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신생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전시대의 재산권과는 단절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대 재산권 제도가 일제강점기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권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변화를 겪으면서 이러한 주인 없는 땅과 시설, 기업체들은 "귀속재산(적산)/歸屬財産(敵産)"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상당한 수의 기업체들과 시설들은 불하(拂下)되었으나, 아직 많은 양의 토지의 경우 국유지 내지 시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자산을 관리 및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기술을 "국유재산관리(國有財産管理)"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재정_http://www.openfiscaldata.go.kr)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은 본래 기획재정부였지만, 적은 수의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으로, 국유재산 무단방치, 무단점유 등 관리 미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왔으며, 업무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물품관리 총괄청인 조달청이 국유재산관리 사무의 일부를 장리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2011년 국유재산법에 조달청의 위임근거가 마련되며 조달청의 사무의 하나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 수립과 제도운영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조달청은 총괄청의 정책업무를 지원하면서 국유재산 현황조사, 관리실태 점검 등 위임된 총괄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위탁에 따라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있습니다.
관급경제(管給經濟)는 시장 참여자로서 '정부'만이 갖는 특징을 활용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보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 제한조건을 갖고 있지만, 기업이 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나 시장 균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비축(原資材備蓄)' 사무는 관급경제 사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에 제정된 조달기금법을 통해서 조달청은 원자재와 같은 중요물자에 대하여 비축사업의 사무를 장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 조치로 중요물자의 구매, 보관, 조작 및 방출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가공산업이 발달한 대한민국에 입장에서 부족한 부존자원을 국가 차원의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이루어졌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가운데 있었던 수 많은 물가파동으로 물가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부비축은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석유파동에 의하여 조달청에 위임된 정부비축 기능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민간경제 비중이 확대된 1980년 이후에는 단기적인 물가안정 보다는 중장기적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 환경관련자재류의 비축 등 다양한 목적이 원자재비축에 부가되었습니다. 통상분쟁이 빈번해진 현재는 희토류와 같은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여 안정적인 국가 산업 보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달을 하려는 시도도 존재합니다. 특히, 1996년 도입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단순한 관급을 넘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10. 조달(調達) 및 물자관리(物資管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
1948년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첫 조달 및 물자관리행정은 외자(外資)를 통한 조달과 외자에 대한 관리와 귀속재산을 통한 자산관리였습니다. 산업과 금융의 기반이 미약한 신생국가로서 외자와 귀속재산에 강력하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외자에 대한 구매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경제 존립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건국 1년 안에 정부조직법에도 등장하지 않는 임시 조직인 외국 원조 물자에 대한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과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임시관재총국(臨時管財總局)이 설치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은 1년만에 외자구매 기능만을 대통령 소속의 외자구매처(外資購買處)와 그 나머지 관리 기능을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관리청(臨時外資管理廳)으로 분리됩니다. 이는 제한된 외국 원조와 외자의 수입을 보다 강력히 대통령이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이지만, 곧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외자청(外資廳)으로 통합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관재총국 또한 1년만에 국무총리 소속 외청인 관재청(管財廳)으로 승격됩니다. 이후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전과 함께 재무부 관재국으로 이관되고, 지방관재관서는 지방사세관서로 기능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관됩니다.
임시외자총국직제[대통령령 제49호, 시행 1949. 1. 17.]
제1조 외국원조물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임시외자총국을 둔다.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법률 제72호, 시행 1949. 12. 10.]
제1조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과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외자구매처를 둔다. 전항의 자금중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외자구매처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 외국기관 또는 수입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품목, 규격 또는 거래의 방법을 지정하여 외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외자구매처직제[대통령령 제237호, 시행 1949. 12. 15.]
제1조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외자구매처를 둔다.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법률 제79호, 시행 1949. 12. 19.]
제1조 수입된 외국원조물자에 관한 관리, 배당, 경리 기타 그 부대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직속하에 임시외자관리청을 둔다.
임시관재총국직제[시행 1948. 12. 29.]
제1조 단기4278년 8월 9일 이전의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한 농지이외의 일체의 재산(以下 歸屬財産이라 稱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임시관재총국을 둔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 1949. 12. 19.] 제5장 관재기관
제37조 본법에 규정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직속하에 관재청을 둔다.
관재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관재청직제[시행 1950. 4. 24.]
제1조 관재청은 귀속재산의 관리와 매각, 관재위원회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연합국 및 일본을 제외한 패전국소속재산의 관리 기타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외자청(外資廳)은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조직법상 기구로 격상되며, 이승만 정부 2기의 상징이었던 산업부흥 컨트롤타워였던 부흥부(副興府)의 외청으로 편입됩니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국의 원조는 반드시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생명줄에 해당했던 미국의 원조와 차관은 미국 정부의 동맹국 정책 변화와 과도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정부 말기 줄어듭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왔으며, 실질적으로 제1공화국의 몰락과 4.19 혁명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에 핵심에 있었던 기구가 바로 외자청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시행 1955. 2. 7.]
제20조 부흥부장관은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외자청직제[시행 1955. 2. 17.]
제1조 외자청은 외자구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61년 5.16 군사혁명과 함께 출범한 혁명정부에서는 한국전쟁으로 폐허화된 국내 산업시설이 복구되면서, 내자조달과 시설공사를 국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내자와 외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인 경제기획원 산하의 외청으로 조달청(調達廳)이 출범하게 됩니다. 기존에 내자(內資)와 공공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총무처(總務處)의 경리국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자(內資)와 외자(外資)의 통합 때에 조달청을 건설부 산하에 둘 것인지, 경제기획원 산하에 둘 것인지, 내각사무처/총무처 산하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부흥부 폐지와 함께 신설된 건설부 산하 외청으로 있었다가, 강력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관리를 위하여 경제기획원 산하의 외청에 두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시행 1961. 10. 2.]
제12조 (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제13조 (경제기획원의 조직과 소속기관)
③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需品을 除外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계약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조달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국·내자국·외자국과 감사실을 둔다.
④전항의 내자의 구매·공급과 관리의 범위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⑤경제기획원장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과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조달청직제[시행 1961. 10. 2.]
제1조 (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내자(中央官署의 共通品目에 限한다) 및 외자(軍需品除外)의 구매, 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관장한다.
1963년 제3공화국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조달청은 재무 당국에 조달청을 두어야 한다는 관료들의 조언을 수용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재무부 산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대규모 국가 주도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획 당국보다는 재무 당국 산하에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정부조직법[시행 1963. 12. 17.]
제26조 (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외국환과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需品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조달청직제[시행 1963. 12. 17.]
제1조 (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授物資를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초기 조달 조직의 형태는 관리국, 내자국, 외자국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국은 조달 행정의 전반과 조달 기금의 운용을 장리하였습니다.
내자국은 내자 전반에 대한 조달과 시설 공사에 대한 조달 사무를 장리하였습니다.
외자국은 외국원조와 외국차관을 통한 조달 사무를 장리하였습니다.
당시 민간 차원의 대규모 구매처가 부재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 산업의 발달과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급(管給)을 통한 산업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중앙 조달 기구는 제3공화국의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의 핵심 기구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물자 통제가 강력히 이루어졌던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무 당국의 집행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1966년에 제정된 조달기금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과정 가운데 물가 통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측면의 가격 통제 및 수급 통제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달기금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조달기금법[시행 1967. 1.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수요물자와 물가의 급격한 변동의 방지를 위한 중요물자의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기금을 설치·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정부수요물자"라 함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수요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달청장이 정하는 조달물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요물자"라 함은 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에 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물자를 말한다.
1. 비료/2. 씨멘트/3. 철강재/4. 목재/5. 판유리/6. 면사/7. 섬유류/8. 생고무/9. 석탄/10. 석유/11. 지류/12. 곡류/13. 기타 생활필수품·원자재와 시설자재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
③이 법에서 "조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의 운용"이라 함은 정부수요물자와 중요물자를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1972년 제4공화국에 이르러 여러 경제 위기가 닥치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조달청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원자재발(發) 위기가 발생하면서, 조달청은 물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물자조정국을 두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 공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설계약국도 기존 내자국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물가 불안으로 귀결되어 국가 주도 계획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1976년 물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제기획원 산하로 외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제5공화국 또한 물가 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시책이었기 때문에 조달청은 경제기획원이 폐지되고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존재했습니다.
정부조직법[시행 1976. 12. 31.]
제23조 (경제기획원) ⑤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需品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신설 1976·12·31>
조달청직제[시행 1976. 12. 31.]
제1조 (직무) 조달청은 정부수요물자 및 중요물자(조달기금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에 관한 사무와 물품의 관리·조정 및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의 변화로는 소속기관의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1976년 세부적인 조달 물자의 보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중앙보급소가 조달청의 소속기관으로 독립되었으며, 이는 1980년 중앙보급창, 2005년 중앙구매사업단, 2007년 품질관리단의 개칭을 통해 2014년부터 조달품질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자국의 보급과, 검사과가 독립한 형태였습니다. 이후에는 규격과까지 중앙보급창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 1999. 5. 24.]
제2장 조달청
제3조 (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장 중앙보급창
제13조 (직무) 중앙보급창은 조달물자의 보관·공급·품질시험 및 물가조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994년 경제기획원 폐지에 따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면서 조달청은 다시 재무 당국 산하의 외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점차 민간 부분의 경제 역량이 커지면서, 조달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아지고, 정부 또한 소비자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조달 행정 또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조달의 중앙통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를 전자조달 제도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02년 등장한 나라장터 전자조달은 이러한 조달행정 개혁 가운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자 조달 사무와 외자 조달 사무 부분의 통합과 분리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공공조달이라는 공통된 측면이 강조되면 구매국의 이름으로 통합되기도 하였고, 외자 구매 제도의 특수성과 원자재 해외 구매 측면이 강조되면 국제물자국의 형태로 분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WTO 체제가 진행되고 국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략물자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산업보호'의 취지에 따라 내자와 외자를 구분하는 측면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  |
2011년 국유재산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조달청은 기존에 있었던 물자 관리 사무를 활용하여 보다 큰 범위인 국유재산관리 사무를 장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재무부처의 국고국(國庫局)의 사무였던 것을 재무 부처의 지나치게 다양한 사무를 외청에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조달행정과는 다른 측면이 강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고도성장기를 벗어나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자산과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달청에 해당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조달청에는 국유재산을 장리하는 하부조직이 생겼으며, 현재는 공공물자국 산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조달 조직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원자재발 수급불안이 지속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해외 원자재 개발 및 조달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물자국에 원자재비축 부문이 강조되었던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장비의 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중요하게 다루는 하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정경제의 강조로 말미암아 조달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독 사무를 장리하는 부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이 신설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하부조직의 명칭과 세부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구색을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중앙조달 기능과 물자관리 기능을 장리하는 조달 및 물자관리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조직인 재무부(財務府)와 하위 외청들에 대한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Government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6 금융경제부] 1. 금융경제(金融經濟)와 금융하부구조(金融下部構造), 금융법률(金融法律) (0) | 2020.03.19 |
|---|---|
| [005 재무부] 6. 제언: 재정(財政)의 역할과 재무부(財務部)의 독립성 (0) | 2019.11.19 |
| [005 재무부] 4. 관세(關稅) 및 국경관리(國境官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 (0) | 2019.08.19 |
| [005 재무부] 3. 조세(組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 (0) | 2018.10.31 |
| [005 재무부] 2. 재무(財務) 조직의 의의와 변천 (0) | 2018.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