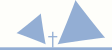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09/09 - [:: Government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1.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의의와 한계
2018/09/14 - [:: Government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2. 국정보좌(國政補佐) 조직의 의의와 변천(秘書,政務,司正)
2018/09/21 - [:: Government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3. 공보(公報) 조직의 의의와 변천
저번 포스팅에서는 국정보좌(國政補佐)의 기능 가운데 '공보(公報)'를 담당했던 조직인 공보처, 공보부, 국정홍보처 등의 목적과 그 변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정보좌(國政補佐)를 수행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부총리제(副總理制)'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국정보좌를 관련하여 멍가이의 생각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9. 부총리제(副總理制)의 의의와 변천
부총리제(副總理制)는 정치제도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궐위(闕位)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국무총리의 사무를 대신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부총리는 총리에 버금가는 자리로서 관련되는 각부장관들에 대하여 일정한 지휘, 조정,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30가지가 넘는 주요 부,처,청에 대한 지휘, 조정, 감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부총리제도는 '조정'의 기능이 강조되는 조직제도로 분류됩니다. 각 부처에 갈등이 발생하여 사무,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총리라는 상급의 지위를 두어 이를 조정할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다양한데, 개개의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이, 행정사무의 갈등의 경우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이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와 현실이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총리제도를 두는 이유는 기획재정부,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원 등 각 부처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성이 큰 부처에게 큰 권한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부총리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1963년입니다. 제3공화국은 경제발전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을 경제기획원 아래에 두었으며, 경제기획원을 선임부처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부총리라는 직함을 부여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1963.12.17) 제15조 (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제6공화국에 이르러 북방외교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완화에 따라서 통일원이 부총리의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1990.12.27) 제17조 (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함께 작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축소화와 결부되어 부총리제도는 잠시 명멸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01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교육이 부총리의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2001.1.29) 제19조의2 (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이어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 분야가 부총리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총리의 숫자가 3명으로 늘어난 시기였습니다.
정부조직법(2004.9.23) 제19조의2 (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다시 작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부총리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선임부처'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데서 보여지듯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부총리격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부총리는 다시 2명으로 늘게 됩니다.
정부조직법(2013.3.23)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1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정부조직법(2014.11.19)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10. 부총리제(副總理制)와 대통령비서실(大統領秘書室) 그리고 국정보좌(國政補佐)
부총리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학에서는 근거규정이 없는 제도인 부총리제를 합헌으로 볼 것인가, 위헌으로 볼 것인가에 있어서 견해가 갈립니다. 합헌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정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 합헌임을, 위헌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근거규정이 없기에 근거규정이 없는 정부조직은 구성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서는 부총리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견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에서 부총리제도는 선임부처의 장관이 겸임하며, 이로써 각 부처 사이에 암묵적인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각 부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원만한 조정이 가능케하는 응당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견해를 강조합니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각 부처 사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열을 매김으로 '장관 위의 장관'이라는 비합리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중요한 정부조직이 있는데 바로 '대통령비서실(大統領秘書室)'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의전(儀典), 생활(生活), 정책(政策), 정무(政務), 민정(民情), 사정(司正), 공보(公報), 인사(人事)의 사무를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앞서 '국정보좌의 변천'에서 살펴보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굵직한 사건들의 진원지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전임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 사무는 항상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비서실를 둘러싼 역사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심도있게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흔히 '맛 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렇기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비서실은 그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기에 개편의 대상에서 항상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없는 '대통령비서실'은 그 무제한(無制限)으로 말미암아 항상 월권 시비에 휩쌓이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아니하기에 정당성(正當性)의 시비에서 항상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한과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가 없이는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월권 행위와 후임 정권의 보복성 수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관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정한 재량이 관료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입법-행정-사법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대한 국정보좌 조직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은 정부조차도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말미암아 입법부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폐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료와의 괴리가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갔으며, 3권분립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수준에 까지 이른 것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입법-사법의 견제가 대통령 임기 가운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입법과 사법의 견제가 가능한 위치로 스스로의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자신이 수행하는 방대한 사무를 행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국가를 이끌어갈 재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국정철학을 같이 만들어온 일부 시장(市場), 학계, 시민사회, 언론, 공직사회의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여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대통령이 지닌 재량 가운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이 최소한의 견제 없이 수행된다면 이는 건강한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대통령의 재량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하며, 기존 공직사회와의 적절한 견제와 존중이 같이 가야합니다.
멍가이가 생각하기에 헌법의 근거가 없는 두 제도와 조직인 부총리제와 대통령비서실은 각각의 특성과 취약성을 보완하는 가운데 보다 적절한 제도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적절하게 수행할 제도로서 부총리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임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로 임명되는 기존의 부총리제도와는 달리 제안하는 부총리제도는 별도의 지위로서 소수의 보좌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 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의 행사를 용이케 하는 제도입니다. 관료사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의 경우 공직에 대한 일정정도의 장악과 견제는 필요합니다. 또한, 대통려비서실이 축소된다면 이는 국무총리와 행정부의 권한이 보다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휘의 역할로서 부총리의 지위는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지나친 밀실행정과 검증이 부족한 인물의 기용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부총리로 이양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국무위원으로 둠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검증을 보다 용이케 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의 재량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인사에 대한 입법부의 검증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무총리, 장, 차관의 인사방식과 동일하게 입법부의 검증을 거치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는 달리 입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한 인사의 적격성 정도만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직속부처를 제외하고(총무, 법제, 기획조정, 정무, 공보) 이외의 행정각부는 5개의 분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經濟), 문교(文敎), 사회(社會), 내무(內務), 외무(外務)가 그것입니다. 경제부총리(經濟副總理)는 경제 관련 부처에 대한 자문 및 대통령에 대한 경제 자문을 담당하며 재무부, 경제산업부, 경제금융부, 농림축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문교부총리(文敎副總理)는 교육, 학술 관련 부처에 대한 자문 및 대통령에 대한 교육, 학술 자문을 담당하며 교육부, 문화부, 과학기술부 등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부총리(社會副總理)는 가정, 사회정책 관련 부처에 대한 자문 및 대통령에 대한 가정, 사회정책 자문을 담당하며 사회가족부, 보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내무부총리(內務副總理)는 안전, 안보, 지방 관련 부처에 대한 자문 및 대통령에 대한 지방행정, 민정, 치안, 안보 자문을 담당하며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외무부총리(外務副總理)는 외교, 통일 관련 부처에 대한 자문 및 대통령에 대한 외교, 통일 자문을 담당하며 외무부, 통일부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총리는 각각의 자문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사무처를 산하에 둘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과 겸임할 수 있겠으며 해당 사무처를 자신의 수행조직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총리조직은 헌법에 규정된 조직이 아니기에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와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대하여 부총리의 자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겠습니다. 국무총리의 국무통할의 권능에 있어서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은 부총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아니하며, 행정각부 또한 반드시 부총리의 결재를 통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국무통할의 권능 아래에 위치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관련 수석비서관이 부총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의 권능을 국정보좌의 기본인 정무(政務)-민정(民情)/사정(司正)-공보(公報)-의전(儀典)에 국한시켜 비정상적이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과 실무에 있어서는 기존 공직 사회와의 견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보좌역을 행정부 내로 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정보좌(國政補佐)를 수행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부총리제(府總理制)'에 대한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보다 적합한 개선방안에 대한 멍가이의 제언을 첨언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정보좌(國政補佐)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과 부총리제(府總理制)"에 대한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Government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5 재무부] 1. 재무(財務)와 재정(財政), 재정법률(財政法律) (0) | 2018.10.24 |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5. 제언: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정상화의 필요성 (0) | 2018.09.28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3. 공보(公報) 조직의 의의와 변천 (0) | 2018.09.21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2. 국정보좌(國政補佐) 조직의 의의와 변천(秘書,政務,司正) (0) | 2018.09.14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1.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의의와 한계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