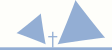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08/02 - [:: Government ::] - [002 법제처] 1. 법제(法制)업무와 행정사법(行政司法)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제 업무란 무엇인가"와 "행정사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국이래 법제업무와 행정사법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法制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법제처의 변천(법제처의 목적)
법제 업무는 삼권분립에 기해서 이루어진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를 법령 내지 재결로 매개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권분립 이전에 법제 업무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도 법제업무와 비슷한 법령심의를 하는 기관이 국가행정기구 내에 존재했는데, 바로 검상(檢詳)이었습니다. 검상은 의정부 소속의 정 5품 관직으로서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법제관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상은 조선초기부터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법제 업무를 장리하는 '법제처(法制處)'라는 이름의 기구를 출범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었으며, 법제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를 세운 유진오 박사였습니다.
정부조직법(1948.7.17) 제33조: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명령안의 기초·심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제처직제(1948.11.4) 제1조:
법제처는 국무총리에 소속하여 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법률명령안의 기초에 관한 사항
2. 법률명령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상신에 관한 사항
3.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와 수정에 대한 의견상신에 관한 사항
4. 전3항에 게기한 이외에 법제에 대한 의견상신에 관한 사항
1955년 제2차 헌법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고, 총무처와 제반 국무총리 산하 기관은 국무원의 산하로 편입되는 가운데, 법제처는 법무부의 법제실(法制室)로 편입되게 됩니다. 다만, 법무부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형식으로서 존재하여, 장관 밑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가운데, 장관 밑에 장관이 있는 조직 상 흠결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정부조직법(1955.2.7) 제17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법제실직제(1955.2.17) 제1조:
법제실은 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률안, 명령안등의 기초에 관한 사항
2. 법률명령의 제정, 폐지, 개정 및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와 수정에 관한 사항
4. 전3호에 게기한 이외에 법제에 대한 의견상신에 관한 사항
5. 법령집 편찬에 관한 사항
1960년 4.19혁명에 따라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국무총리제도가 다시 부활하면서, 법제실은 국무원 사무국이 국무원 사무처(國務院 事務處)로 확대 개편되는 가운데 통합되어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法制局)로 조직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됩니다.
국무원사무처 직제(1960.7.1)
제1조: 국무원사무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 법제, 인사, 상훈, 방송관리와 기타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국무원사무처의 차장 2인중 1인은 법제사무를 담당하고 1인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1961년 6월 5.16 군사혁명에 따라서 다시 국무원 사무처는 '내각 사무처(內閣 事務處)'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보업무는 신설된 공보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어서 1961년 10월에는 법제업무는 독립하여 다시 '법제처(法制處)'로 조직되며,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됩니다. 군사혁명에 따라서 대대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했으며, 그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법제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판단 하에, 일제시대 법령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행정을 전담하는 기구가 독립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내각사무처직제(1961.7.12) 제1조
내각사무처는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법제, 인사, 행정관리, 상훈과 기타 내각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정부조직법(1961.10.2) 제15조
①내각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법제처를 둔다.
법제처직제(1961.10.2) 제1조
법제처는 내각에 소속하여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내각수반의 명에 의한 법률안과 명령안의 기초에 관한 사항
2. 각의에 상정될 법률안, 조약안, 각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
4. 법령집 및 법제자료의 정비와 편찬에 관한 사항
다만, 법무부 법제실에 편입-독립되는 가운데에서 '의견상신 기능', 곧 법령 해석 기능은 건국 당시 법제처에 소관이었다가 법무부와 통합되는 가운데 법무부로 남게되었고, 법령심사, 법제정비 기능만 독립되어 신설 법제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제5공화국에 이르러 법제처는 급속히 직무분야를 넓혀갑니다. 기존의 좁은 의미의 법제업무 분야였던 행정입법 분야에서 행정사법 분야로까지 직무가 확대됩니다.
1984년에는 법무부에 존재했던 법령해석 기능 가운데, 법무부 소관법령(민법, 형법, 상사법, 소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법령들의 해석기능을 이관받았습니다.
1986년에는 총무처의 소속이던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기능까지 이관받았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행정심판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맡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제처직제(1984.12.31) 제2조
법제처는 국무총리에 소속하여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법제처직제(1986.6.14) 제2조
법제처는 국무총리에 소속하여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하지만, 문민정부 이후 장관급 및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 격하되는 과정을 빈번히 겪게 됩니다. 1996년에는 장관급으로 격상, 1998년에는 IMF 금융위기로 인한 작은 정부의 기조로 인한 차관급 격하, 2004년에는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 2008년에는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는 20여년간 법제처 소관이던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법제처는 차관급 크기의 기능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으로 남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직제(2008.2.29) 제3조
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법제처직제(2008.2.29) 제2조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04. 법제처의 조직(조직의 변천)
법제처의 구성에 대해서는 1961년 10월에 구성된 새로운 법제처에 대한 조직에서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이전 법제처, 법제실의 구성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966년 법제처는 단촐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지만, 총무처와 달리, 많은 관료의 직급이 총무처의 그것에 비해서 낮거나, 하부조직의 구성이 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정부입법 기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법령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제1국 산하의 조사과에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따라서 행정의 역할이 커졌고, 민주화가 더디 진행될 수록 입법부의 입법 능력보다 행정부의 입법 능력이 보다 전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의 전문성의 깊이가 깊어질 수록 조직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법령심사의 기능만 수행했던 과거의 법제처 조직과는 달리, 법제연구, 조사, 보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제조사국이 제1국에서 독립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내각 법제국의 모습을 본받아 법령심사를 행하는 하부조직을 기존에 2개에서 3개로 늘렸습니다. 기획관리관은 법제관의 수를 늘리고자 했던 법제처의 의도에 따라서 법령심사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법제조정실의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1981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행정심판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초기에 총무처가 맡았던 행정심판 사무는 1986년 법제처로 이관됩니다.
1989년 법제조사국/법령정보국은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연구의 전문성의 확보와 법전 편찬의 목적이 공공의 목적보다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독립하게 됩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말기 법제처는 조직의 정비를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법제조정실이 하고 있었으며, 법령심사와 법령해석은 단일국(單一局)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었으며, 행정심판관리국의 이름으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IMF 금융위기와 함께, 법제처는 '작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법제조정실이 축소되며 전체적인 부처의 정원 축소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정부의 비대화와 함께 조직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의 법제처의 조직도 입니다. 법령해석 사무는 법령해석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었으며, 법제지원, 법령전산화 작업이 법제조정실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관리국은 보다 세부적인 부처, 직무기능에 따라 하부조직을 재편하게 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통일되지 못한 하부조직의 명칭과 난립했던 조직은 정비되게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편된 법제처 조직은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제처의 의의와 변천"을 「정부조직법」과 「법제처직제」에서 규정된 직무를 통해서 그 목적을, 조직을 통해서 그 기능의 변천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현재 법제처를 둘러싼 여러 견해들"과 "행정사법의 소관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정부조직법」, 「법제처직제」, 「법제처직제규칙」, "법제처 조직 개편의 내용과 의의"(조정찬)을 참조했습니다.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jsp?mpbLegPstSeq=129622)
':: Government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2 법제처] 4. 제언: 법제처(法制處)와 일본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 (0) | 2018.08.07 |
|---|---|
| [002 법제처] 3. 법제처의 직역(行政立法과 行政審判) (0) | 2018.08.06 |
| [002 법제처] 1. 법제 업무(法制 業務)와 행정사법(行政司法) (0) | 2018.08.02 |
| [001 총무처] 4. 제언: 총무처(總務處)의 미래와 제안 (0) | 2018.07.31 |
| [001 총무처] 3. 총무처의 현재(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와 문제 (0) | 201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