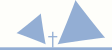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08/09 - [:: Government ::] - [003 기획조정처] 1. 국무통할(國務統轄)과 기획(企劃), 조정(調整), 평가(評價), 조사(調査)
2018/08/13 - [:: Government ::] - [003 기획조정처] 2. 국무통할(國務統轄) 조직의 의의과 변천
2018/08/20 - [:: Government ::] - [003 기획조정처] 3. 국무통할(國務統轄)과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2018/08/24 - [:: Government ::] - [003 기획조정처] 4. 국무통할(國務統轄)과 조사통계(調査統計)
저번 포스팅에서는 국무통할 기능 가운데 조사(調査) 기능을 중심으로,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자 강력한 표현 수단인 통계(統計) 사무와 이를 담당한 조직과 그 목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무통할 기능 가운데 조사(調査) 기능이지만, 현재상황에 대한 진단의 성격이 강한 통계(統計) 사무와는 미래상황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하는 국책연구(國策硏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연구 기능 가운데서도 과학기술계 국책연구와는 다른 씽크탱크 성격이 강한 사회과학계 국책연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 정책(政策)의 의의와 정책 연구(政策 硏究)
먼저, 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政策)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표준국어대사전)
-사회 변동의 계기로서 미래 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혹은 목표와 가치 및 실제 수단을 담고 있는 예정된 계획 (Lasswell)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정정길)
행정학계에서는 '정책학'이라는 분과학문이 있을 정도로 '정책'은 중요한 학문단위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정책학원론'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괄적·보편적으로 정책이라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
정책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은 정당한 권위에서 말미암은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은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의 의사표명으로서 작위, 부작위의 신호를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일종의 목표(정책목표)로서 공공문제의 해결, 목표달성과 관련이 있기에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와 특성을 지닌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정책 연구(政策 硏究)'입니다. 정책 연구란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주된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연구를 국가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 '국책 연구(國策 硏究)'입니다.
10. 국책 연구(國策 硏究)와 그 당위성
정책 연구는 민간이든, 학계든, 국가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마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이 주축이 되어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 다양한 싱크탱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싱크탱크들은 공화당-민주당, 각 대선 후보들의 사상적, 정책적 기반이 됩니다. 또한, 해당 대통령의 정부 임기 동안 정책의 근거와 전략을 만들어내며 관료사회를 뛰어 넘는 역량을 보이곤 합니다. 보수진영에서 대표적인 싱크탱크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보수의 탄탄한 재건과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대표작인 싱크탱크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를 들 수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싱크탱크였습니다.
 |  |
일본의 경우 정부와 기업 그 자체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료사회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보니 정부의 부속기관으로서 정보와 데이터,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내각부 소속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経済社会総合研究所), 경제산업성 소속의 경제산업연구소(経済産業研究所), 문부과학성 소속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国立教育政策研究所), 일본 최대 상업은행의 싱크탱크인 미쓰이스미토모금융그룹의 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책연구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막스플랑크(Max-Planck-Gesellschaft_과학기술연구), 헬름홀츠(Arbeitsgemeinschaft der Großforschungseinrichtungen_거대과학연구), 라이프니츠(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_인문,사회,과학,공학 연구), 프라운호퍼( Fraunhofer-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 V_응용과학연구)의 4대 연구협회가 그것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  |
중국의 경우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행정기구인 국무원 산하의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35개의 산하 연구원이 존재하며, 문사철(文史哲)-경제(經濟)-법사정(法社政)-외교(外交)-공산주의(共産主義)의 5개의 주제로 연구원들을 묶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의 국책연구/싱크탱크 들은 각각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 연구원과 연구기관이 강력한 독립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는 학계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관료를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료와 연구원 사이의 강한 결속력을 띠는 것이 정책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책연구 기능은 제3공화국에 출범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제2공화국때 기획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기획,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사혁명정부는 과학적인 조사,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연구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정과 그 결과가 다소 미흡했던 이유는 군사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기도 했지만, 기획단계에서 과학적 조사와 분석보다는 단순 토론에 불과했던 당시 기획 능력 탓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이희일은 경제기획원 차관이었던 김학렬 차관의 동의를 얻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김학렬 차관이 부총리로 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사재 100만원의 출연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을 지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초대 설립형태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지만 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 산하가 아닌 독립 재단법인의 형태로 독립적인 이사회,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중동문제연구소(현 산업연구원 KIET) 등이 설립될 당시 국책연구기관은 석·박사급 고급 두뇌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당시 학계와 민간 모두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회장이 고속도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고, 당장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선진국인 일본에서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던 기업에서 싱크탱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제한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부족했던 대한민국 학계의 분위기는 고급인력으로 하여금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국책연구소는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고급 인력을 국내에 머무르도록 유인하고, '국가 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정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  |
하지만, 당시 문교부를 중심으로 한 학계에서는 국책연구소의 설립을 극렬히 반대했었습니다. 국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국가권력에 의해 연구의 자유와 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학계의 지나친 우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기 대한민국의 격변의 정치상황 속에서도 국책연구는 최고지도자들의 굳건한 신념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일부지표에서 아시아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원 초기에 세계 10대 교육정책 싱크탱크로 평가받았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싱크탱크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국책연구소를 반대했던 학계와 민간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싱크탱크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싱크탱크 평가지표로 알려진 '한경비지니스 싱크탱크 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대한민국의 국책연구는 성공적이었으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국책연구는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 대한민국 국책연구의 변화와 현재: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국가의 책무 중 많은 부분이 민간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국가의 역할이 재편되는 지금 국책연구는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 현 산업연구원)이 전부였던 국책연구기관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민간의 역량이 커감에 따라 민간자본의 씽크탱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Only one에서 One of them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각각의 국책연구기관들은 생존의 전략을 세워가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작은정부로의 시책에 따라서 각 정부부처 산하에 있던 총 23개 경제·사회 분야 국책연구원들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개별법으로 설립되었던 각 국책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통합적으로 관리, 육성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999.1.29)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는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경영 혁신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연구회가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체계적으로 감독-평가-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연구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금을 줄이는 대신에 재원의 부족분은 더 많은 외부 수탁 용역 연구를 수행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국책연구원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예산제도(PBS)의 도입과 국책연구원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의 분류, 국책연구과제의 경쟁체제의 도입 등은 보다 효율적인 국책연구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한 기사(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4678.html)를 찾아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을 보면,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금 가운데 자체수입금이 더 많은 국책연구원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은 정책 관련 기본연구과제, 현안 이슈 페이퍼, 외부 수탁 과제 등으로 나뉩니다. 기본연구과제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예산과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각 국책연구원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의미합니다. 반면, 외부 수탁 과제는 외부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는 용역과제에 해당합니다. 복지 재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출연보조금이 매년 줄어드는 탓에 국책연구원들은 기본고유과제보다는 외부 수탁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이전보다 집중하는 듯 합니다. 이는 숫치상으로도 나타나는데, 매년 국가정책 연구 보고서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외부 수탁 과제를 독려하며 연구원들의 재무적 유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책연구소가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수요를 담당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소 지나친 외부 수탁 과제로 국책연구원이 집중을 하다보니, 진지하게 국가정책 연구를 고민하며 오랫동안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월한 연구에만 집중하는 풍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관료들이 직접 석, 박사를 따는 상황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관료들의 국책연구원들을 향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곧 정책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료 사회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문민정부 이후 나타난 불안정한 정치상황, 전임정권의 인사라 하여 "적폐"로 몰리며 연구소의 폐쇄로 나타나는 변동성이 커진 상황은 국책연구원들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인 "중장기 전략 제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내, 대외적인 국책연구 기능의 위기는 고급인력이 더 이상 국책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을 이유를 없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책연구원들은 민간 싱크탱크, 학계, 해외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균형발전'의 대상이 되어버린 국책연구기관들이 서울특별시가 아닌 각 지자체로 이동하게 되면서, 고급인력들은 지방으로 가는 것에 저항이 생겨 고급인력의 충원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대학원생이라는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는 학계와 비교해서도, 효율적인 고급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연구원의 대내, 대외적인 위기는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에 요구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실용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구조 개편안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전략 업무를 전문화하는 방안, 이전처럼 각 부처의 연구기관으로 돌리는 안, 종합사회과학연구소로 개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인 반대와 국책연구원 노조의 반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보면, 국책연구소에 대한 구조적 개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막스플랑크협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는데, 예산지원을 받는 대신 협회 소속 연구소들이 각자의 성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각자가 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 개편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독일 국책연구협회의 이상적인 모습만 그리지만, 실제는 1980년-1990년대에 27개의 연구소가 폐쇄되고, 18개의 연구소가 신설되는 등, 내부적으로의 경쟁과 쇄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독립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전의 위상과 역량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원에 대한 정체성과 구조개편은 논의되고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하지 않아 관리, 감독이 되지 아니하는 국책연구소를 비롯하여, 지나치게 분산되어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국책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통폐합, 총괄, 관리, 육성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무통할 기능 중 조사(調査)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기능 가운데서도 국가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國策硏究)/싱크탱크(Think-Tank) 기능에 대해서 그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언으로서 기획(企劃)-조정(調整)-평가(評價)-조사(調査)의 국무통할(國務統轄)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처(企劃調整處)'에 대한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Government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1.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의의와 한계 (0) | 2018.09.09 |
|---|---|
| [003 기획조정처] 6. 제언: 국무총리의 국무통할과 기획조정처(企劃調整處)의 필요성 (0) | 2018.09.04 |
| [003 기획조정처] 4. 국무통할(國務統轄)과 조사통계(調査統計) (0) | 2018.08.24 |
| [003 기획조정처] 3. 국무통할(國務統轄)과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0) | 2018.08.20 |
| [003 기획조정처] 2. 국무통할(國務統轄) 조직의 의의과 변천 (0) | 2018.08.13 |